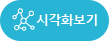| 항목 ID | GC09000434 |
|---|---|
| 한자 | 日帝 强占期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집필자 | 김헌주 |
[정의]
1910년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 병합 이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 때까지의 충청남도 부여 지역의 역사.
[개설]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일본에 의하여 강제 병합되면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기 시작하였다. 일제 강점기는 헌병 경찰이 행정과 경찰 업무를 겸임하는 1910년대 무단 통치기, 민족 분열 정책을 썼던 1920년대 문화 통치기, 그리고 1930년대부터 1945년 일제 패망까지의 민족 말살 통치기 등 세 시기로 구분된다. 그런데 민족 말살 통치는 사실상 중일 전쟁이 시작된 1937년 이후부터 시작되므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가 총독으로 재직하던 1930년대 초중반은 별도의 시기 구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 맞서 조선인들은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대에는 만주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민족해방운동 기지를 건설하였고, 국내에서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다. 1920년대 문화 통치기와 1930년대 초중반에는 신간회 등의 민족 협동 전선 및 조선인들의 제반 권리 청원 운동이 활발하였으며,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민족 말살 통치기에는 중국 관내에서 민족 통일 전선이 구축되었고 임시정부에는 광복군을 중심으로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결국 1945년 8월에 제2차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일제의 식민 통치는 막을 내리고 한국인들은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되었다.
[행정 구역 개편]
오늘날의 부여군이 형성된 것은 1913년 12월 「조선총독부령 111호」에 의하여 군면폐합(郡面廢合)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면서부터였다. 일제는 1914년 전국의 317개 군현을 220개 군으로 통폐합하였는데, 군면 통합의 기준은 각 군면의 면적, 호구 수, 자산 정도 등이었다. 군면폐합 이후, 4개 군에 소속된 50개 면은 1개 군, 즉 지금의 부여군에 소속된 16개 면으로, 그리고 467개 동리는 191개 동리로 통폐합되었다. 2.5개 정도의 면이 1개 면으로 통합된 꼴이었다.
1914년 군면폐합과 더불어 부여군청은 부여군 현내면 관북리[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에 속하게 되었으며, 임천·석성·홍산 등 나머지 군의 동헌 건물은 모두 면사무소로 개조되었다. 현내면은 1917년 조선면제 실시 시기에 부여면으로 개칭되었다.
[독립운동]
일제의 식민 통치 기간 내내 부여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이 끊이지 않았다. 1910년대에는 독립의군부와 대동단 등이 활동하였다. 독립의군부는 1912년 임병찬(林炳瓚)[1851~1916]이 고종의 명령을 받고 조직한 단체이며, 복벽주의를 주장하였다. 1919년 3월 말경 대동단은 일제에 대한 독립, 세계 평화, 사회주의 실행 등 3대 강령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 총독 체제하의 무단 통치가 이루어지던 시대적 특성상 독립의군부와 대동단 등의 활동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부여 지역 출신으로 이용철, 조중구, 문창수 등이 독립의군부에 참여하였고, 이건호가 대동단에 참여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벌어진 1919년 3·1 운동에 부여인들도 참여하였는데, 3월 6일에는 임천면의 헌병출장소에서 만세 시위를 벌였고 은산면에서도 만세 시위가 있었다. 다음 날인 3월 7일에는 백마강 변에서 부여 시내까지 행진하며 만세 시위를 벌였다. 부여 지역 천도교도들은 3·1 운동 주도자들이 체포된 이후 운동 방향을 전환하여 기도미 납부 운동을 전개하였다. 기도미는 교인의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5홉가량을 청수와 같이 올려 기도한 후 모았다가 지역 교구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민족해방운동의 자금 확보를 위한 방책이었다.
1920년대에는 청년 단체 운동, 야학, 농민조합 설립 운동 등 다방면에서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 청년 단체는 각 면별로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홍산면의 홍산청년회, 규암면의 규암청년회, 구룡면의 구룡청년공지회, 임천면의 임천청년회, 부여면의 부여청년회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 단체들은 강연회 실시, 야학 개설 등의 방법으로 근대 지식을 보급하고자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1920년대 후반부터 성격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노명우와 이호철, 우기섭 등이 있었다. 노명우 등은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고 수용한 이들이었으며, 청년 단체에 의한 부여 지역 사회운동의 변혁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부여 지역에 1931년 혁명적 농민조합 결성도 추진되었다. 부여 지역의 농민조합 운동을 주도한 이는 노명우, 이문용 등이었다. 1930년 노명우와 이문용 등이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지만 경찰의 방해로 무산되었고, 이듬해인 1931년 6월에도 창립대회가 해산되었지만 노명우 등 운동가들은 서면 대회 형식으로 부여농민조합을 창립하고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부여 지역에서는 1910년대 독립의군부 및 대동단 활동과 3·1 운동, 1920년대 청년운동과 농민운동 등 다양한 부문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1930년대 이후에는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은 청년층에 의하여 비밀결사 운동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 김정인 외, 『한국 근대사』2-식민지 근대와 민족 해방 운동(푸른역사, 2016)
- 김상기, 「부여 지역 독립운동의 전개와 특성」(『충청문화연구』20,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8)
- 오대록, 「1920~1930년대 부여 지역 사회운동의 양상과 특성」(『한국독립운동사연구』6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