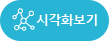| 항목 ID | GC03302006 |
|---|---|
| 한자 | 山-江-公田- |
| 영어의미역 | The Story of Revolution Found within the Names of Mountain, Field, River and Land |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남향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889년 |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895년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07년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01년 |
| 산 | 천등산|시랑산|마두산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
| 골짜기 | 호랑이 웃방골|저고리골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 |
| 고개 | 뱀고개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원공전과 싯개 사이 고개 |
| 샘 | 시랑산샘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소시랑이 북쪽 |
| 마을 | 미륵당|절터골|원공전|장담|싯개[食浦] |
| 들 | 양지뜸[양지편]|음지뜸[음지편]|구름들|만금이들|솔경지|싯개들 |
| 바위 | 용바우|막바우 |
| 전시관 | 자양영당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475번지 장담마을 |
| 민간 신앙 유적 | 짐대|합수머리 서낭당|소시랑이 서낭당|장담 시무나무 |
[개설]
천등산 아래 자리한 공전리는 주포천[일명 공전천]이 마을 전체를 휘돌아 흐르는 아늑한 산골 마을이다. 공전리에서 지방도 38호선까지 이어진 길은 예전에는 우마차조차 다니기 어려운 소로(小路)였다. 공전삼거리에서 구불구불 좁은 오솔길을 따라 마을까지 들어오려면 도보로 1시간 남짓 소요된다.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한 고갯마루는 일제 강점기 순사들의 발길도, 6·25 전쟁 당시 인민군의 발길도 미치지 못하게 한 일등 공신이다.
소시랑이 입구까지 들어오면 실개천을 따라 좌우로 넓은 들이 펼쳐진다. 이 들은 소시랑이에서 남쪽으로 원공전 입구까지 걸쳐 있어 한눈에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한편 장담에서 싯개까지 북동 방향으로 펼쳐진 ‘싯개들’은 주포천 변에 위치해 가뭄 걱정 없는 풍요로운 논이다.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산촌(山村)임에도 농경지가 발달한 천혜의 요새(要塞)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의 “피난곶이로 이만한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귓전에 맴돈다.
공전리는 원공전[1구], 소시랑이[2구], 싯개[食浦], 장담[3구] 등 크게 네 개의 자연 마을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원공전이 인구가 가장 많은 중심 마을이다. 소시랑이 북쪽 느랏과 절터골에도 열 집 정도 거주했으나 교통이 불편하여 30년 전부터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
원공전을 중심으로 소시랑이는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두 마을은 약 1㎞ 가량 떨어져 있어서 원공전에서 소시랑이까지 도보로 30분 정도 걸린다. 싯개와 장담은 각각 원공전의 서쪽과 남쪽에 위치한 마을들이다. 원공전과 싯개 사이에는 동서 방향으로 나지막한 산이 있고, 뱀처럼 구불구불하다고 이름 붙여진 ‘뱀고개’가 있다. 이 뱀고개는 원공전과 싯개를 연결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원공전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의암로[현 도로명]를 따라가면 장담이 있고, 장담에서 공전천 변을 따라 북동쪽으로 올라간 곳에 싯개가 있다. 싯개에는 공전역이 있다. 이곳 공전역은 30년 전만 해도 등하교 시간이면 학생들과 장사치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으나. 열차가 정차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멈춰 버린 듯 썰렁하다.
현재 공전리는 여러 성씨가 모여 사는 각성바지 마을이다. 임진왜란 당시 철원 최씨(鐵原崔氏), 충주 박씨(忠州朴氏), 안동 김씨(安東金氏) 등 세 성씨의 조상들이 마두산 아래 ‘굴바우’로 피신을 했다는 전설이 있다.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피난처로는 손색이 없는 곳이다. 시간이 흘러 그 후손들이 마을 곳곳에 터를 잡기 시작하여 장담은 충주 박씨, 소시랑이는 철원 최씨, 미륵당은 안동 김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으로 발전하였다.
[골골 공전천이 굽이쳐 흐르는 기름진 땅]
1. 임금이 하사한 산골짜기 기름진 땅, 공전
‘공전(公田)’이란 이름에 얽힌 유래는, 높은 벼슬을 한 관리가 마을에 거주했다는 먼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소시랑’이라는 지명과도 관련이 있는데, 오래전 마을에 소씨 성의 ‘시랑’ 벼슬을 한 인물이 살았고, 그때부터 마을 이름을 그의 성씨와 벼슬 명을 딴 소시랑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 역시 ‘시랑산’이라 부른다. 공전이라는 지명의 어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임금이 높은 관리에게 하사한 토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터무니없는 전설은 아닌 듯하다.
산골짜기 깊숙이 자리했으나 공전천 변에 있는 양질의 농경지는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에 충분한 입지 조건이다. 그야말로 전해 내려오는 얘기대로, 오래전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신하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임금이 하사한 옥토(沃土)는 아니었을까?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공전(公田)이라는 지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농사짓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주민들의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은데, 과거에도 부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이 소작농이었다. 그리하여 언제부터인가 그 원인을 ‘함께[公] 토지[田]를 나눈다’는 뜻의 지명 탓으로 돌리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누구라도 자기만 잘살기 위해 노력하면 나누고 살아야 하는 지명의 유래에 위배되어 결국은 더 큰 부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뜻이 숨어 있다. 바닥에 구멍이 난 자루를 닮았다는 형국설도 이를 뒷받침한다. 구멍 난 자루 안에는 어떤 것도 충분히 채울 수가 없지 않은가.
2. 제방을 막으니 싯개들에 풍년 들고
공전리에는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하늘바래기논[天水畓]’은 그리 많지 않다. 공전천이 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개울임에도 사계절 내내 유량(流量)이 풍부하여 가뭄 걱정을 덜게 했던 것이다. 시랑산과 박달재의 작은 샘에서 시작되는 실개천은 원공전의 합수머리에서 만나 공전천에 흘러든다. 공전천에 비해 수량은 적지만 이는 소시랑이의 양지편과 음지편, 원공전의 구름들과 만금이들, 솔경지 일대의 주된 수원이다. 10년 전에는 안정적인 농수 확보를 위해 시랑산 아래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마을 주민들은 30년 전까지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할 정도였다.
이렇게 공전천은 시랑산과 박달재에서 시작된 내와 합쳐져 동북쪽으로 굽이쳐 흐른다. 장담에서 싯개까지 공전천 변에 펼쳐진 넓은 들이 바로 싯개들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수확량이 좋기로 소문이 나서 서울과 봉양읍의 이름난 부자들이 호시탐탐 탐을 내는 땅이었다.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한자로는 ‘식포(食浦)’라고 쓴다.
싯개들은 일제 강점기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개간되기 시작했다. 가뭄에도 한 마지기에 벼 네 가마니의 소출이 났다. 이웃 논에서는 그 절반의 소출도 기대하기 어려워서 싯개들 논을 팔면 이웃 땅의 논 두 마지기를 살 수 있었다.
논 주인들은 고심 끝에 보(洑)를 설치하여 농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시멘트 보가 생기기 전에는 소나무와 진흙, 잡석으로 얼기설기 보를 막았다. 마을 사람 전체가 동원되어 어렵게 만든 관개 시설이었지만 홍수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3년을 나기가 쉽지 않았다.
6·25 전쟁이 끝나고 제천 시내 성당에 부임한 이심[본명 제임스 레이(James Ray)] 신부는 한국의 전후(戰後)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되어 왔던 이심 신부는 마을 주민들의 곤궁한 생활을 안타깝게 여겨 미국 가톨릭 구제회의 기금으로 시멘트 보를 만드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가난한 형편에 옥수수가루와 밀가루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만으로도 무척 감사하게 여겼는데, 보를 막는 일에 참여하면 먹을 것을 준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달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비석에 새겨 두었고, 이심 신부를 기리는 이 비석은 현재 보와 싯개들 사이 수문(水門) 앞에 세워져 있다.
옛날부터 “싯개들에 물이 마르지 않아야 풍년이 든다”는 속신 때문인지 최근에도 제천시의 지원으로 새 보를 튼튼하게 만들었다. 관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 같은 노력이 없었다면 양질의 농경지를 확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3. 비가 오지 않으면 ‘용바우’에 개피를 바르지요
하지에 이르러서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민들의 가슴은 논바닥처럼 바싹바싹 타들어간다. 가랑비라도 한 차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진다. 공전리에서 마지막으로 기우제를 지낸 지도 언 10년이 다 되어 간다.
비가 오지 않으면 주민들은 마을에서 약 3㎞ 가량 떨어진 연방리 공전천 변의 ‘용바우[용바위]’로 비를 내려 달라고 빌러 간다. 용바우는 산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내려온 용처럼 하얗고 넓어서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옆 마을이지만 정작 이곳 용바우는 공전리 주민들의 간절한 치성(致誠)에만 답하는 기우제 터로 유명하다.
기우제를 지내는 날은 으레 개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올리기 때문에 ‘개 천렵 하는 날’이라고도 부른다. 마을 사람들은 먼저 바위 한복판에 갓 잡은 개의 붉은 피를 덕지덕지 바른다. 신성한 동물인 용의 몸에 흉하게 개피를 발랐으니, 틀림없이 노한 하늘이 비를 뿌려 깨끗이 씻어 낼 것이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차마 볼 수 없어 감히 하늘을 유린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주민들의 심정이야 오죽 할까?
바위 앞에는 조촐하지만 정성이 깃든 노구메 한 그릇과 막걸리 한 사발을 올린다. 마을 대표로 뽑힌 제관은 목욕재계(沐浴齋戒)를 하고 정성껏 기우제를 지낸다. 축관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비를 바라는 내용의 축문(祝文)을 읽는다. 신기하게도 주민들의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용바우의 핏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자양영당, 개항기 의병 활동이 시작된 바로 그 곳]
1. 배를 닮은 장담(長潭), 국사교과서 속 제천 의병 활동의 중심지
장담은 배 형국을 한 자연 마을이다. 배에 틈이 생기면 곧이어 난파되는 것처럼 예부터 마을에 우물을 파는 일은 금기시되었다. 북쪽으로는 야트막한 산이 있고, 남쪽으로 주포천이 유선형으로 흘러서인지 전체적으로 반달형을 한 마을이다.
오랜 옛날부터 전체 20호를 넘지 않는 작은 마을이지만 부자가 나는 길지(吉地)로 유명하다. 공전의 3대 부자로 일컬어지는 고씨, 홍씨, 원씨가 모두 장담에 거주한 것도 우연은 아니다. 그 중에는 ‘마름’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 부를 쌓은 이도 있다. 어떻든 재부의 중심에는 장담 서북쪽으로 넓게 펼쳐진 싯개들이 있다. 이처럼 살기 좋은 장담은 국사 교과서 속의 제천 의병 활동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들이 거처한 곳이기도 하다.
장담과 인연이 닿은 첫 번째 인물은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1832~1893]다. 그는 위정척사론을 주장한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으로 김평묵(金平默)을 스승으로 모셨다. 1876년(고종 13)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1889년(고종 26) 춘천에서 장담으로 거처를 옮겨 후학 양성에 힘썼다.
현재 자양영당이 자리한 곳은 유중교가 1889년에 세운 후학 양성 기관인 창주정사(創州精舍)가 있던 자리다. 유중교가 죽자 그의 제자 유인석(柳麟錫)[1842~1915]이 ‘이항로-김평묵-유중교’로 이어지는 화서학파의 정통을 승계하여 학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다. 1895년(고종 32) 5월 유인석은 장담에서 강학을 하던 유중교를 따라 내 건너 마을인 굴탄으로 거처를 옮긴다.
1895년 5월 15일, 유인석은 장담에서의 향음례(鄕飮禮)를 명목으로 각 도의 선비 600여 명을 소집한 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킬 것을 제안하였다. 같은 해 8월 국모인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발표되자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자는 의견이 급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12월 30일 유인석은 영월에서 호좌의진(湖左義陣)의 대장으로 의병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제천 의병은 격문 「격고팔도열읍」과 「격고내외백관」을 전국에 포고하여 봉기의 정당성을 천명하였으며, 양반에서 농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소응(李昭應)[1852~1930] 역시 유중교의 제자로, 을미사변 이후 춘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그 해 12월 6일 의병대장으로 추대된 인물이다. 춘천 의병을 진두지휘한 그는 날로 높아진 기세를 몰아 서울 진격을 감행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 춘천에서 가평에 이르는 50리 길이 빼곡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가평 벌업산에서의 관군과의 전투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후 이소응은 제천 의병에 합류하여 유인석과 함께 의병을 이끌었다.
이렇듯 장담은 유중교, 유인석, 이소응 등 제천 의병을 이끌었던 중심인물들과 연이 깊은 마을이다. 유중교가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자양서사’를 세우고 인근 지역의 선비들을 불러 모을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 일제의 만행에 분노하고 구국(救國)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숭고한 의병 정신이 곳곳마다 스며 있는 곳이 바로 장담이다.
2. 공전, 곳곳에 서린 숭고한 의병 정신
제천 의병 정신의 본고장으로 공전리가 유명해진 첫째 이유는 ‘자양영당’이 있기 때문이다. 1889년 유중교는 춘천에서 장담으로 거처를 옮기고는 자양서사를 세워서 후학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분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나라를 구하려는 의로운 마음을 눈 뜨게 한 만인의 스승이었다. 제자인 유인석과 이소응은 스승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고, 이로써 제천은 전국적인 의병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
이소응은 1906년 3월 스승 유중교가 강학을 하던 장담에 ‘자양영당’을 세울 뜻을 품고 이듬 해 9월 완공을 한다. 이때부터 자양영당에는 주희(朱熹)·송시열(宋時烈)·이항로·유중교 등 네 분 선현의 영정이 봉안되었고, 춘추로 제향을 모시게 되었다. 1945년에는 유인석, 1946년에는 이소응의 영정이 추가로 봉안되었다. 이항로·유중교·유인석·이소응 네 분의 영정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의병들을 기억하게 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성리학적인 역사 인식을 공고히 함으로써 변화에 대처하려는 역사 인식을 보여 주기 위해 화서학파 유학자들인 유중교와 김평묵은 스승 이항로의 명에 따라 『송원화동사합편강목(宋元華東史合編綱目)』을 편찬·판각·간행하였다. 『송원화동사합편강목』의 판본인 ‘화동강목판본’[충청북도 유형 문화재 제37호]은 1982년 자양영당 서편에 세워진 장판각에 보관되어 있다. 자양영당 동편에는 2001년에 제천의병전시관이 건립되었다.
자양영당과 더불어 마을 곳곳에는 의병 활동과 관련된 지명과 숨은 이야기가 전한다. 사실 이 지명들은 이미 오래 전에 생겨난 것인지 모른다. 일제의 침탈이란 충격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누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그 의미 그대로 오늘날까지 전해졌을 것이다. 일본의 강제 침탈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기억의 착종(錯綜)을 일으킬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서론이 길어진 까닭은 의병 활동과 관련된 지명들 중 일부는 시간성을 상실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공전3리 ‘싯개[식포(食浦)]’는 개울가에서 군사들이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여기서 군사는 임진왜란 때의 아군, 개항기의 의병, 6·25 전쟁 당시의 군인 등 이론(異論)이 분분하다.
싯개 서편으로 붙은 자구니재와 예담에도 의병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한다. 먼저 자구니재는 의병들이 묵어간 곳, ‘잠을 자고 간 고개’라 하여 자구니재로 불린다. 멀지 않은 곳에 의병들이 일본군을 막기 위해 잡석(雜石)으로 얼기설기 담을 쌓은 흔적이 보이는데, 바로 이 시설물이 예담이다. 다소 허물어지긴 했지만 철길 가까이에 담을 쌓은 흔적이 뚜렷하다. 이곳은 마두산 밑 깊은 골짜기로, 은신처로는 이만한 곳이 없다. 수세에 몰린 의병들이 가까스로 마을까지 들어와 전열을 정비한 역사적인 장소이다.
원공전의 북서편에 위치한 ‘왜막골’은 낱말 뜻 그대로 왜구를 막았던 골짜기를 가리킨다. 임진왜란 당시 왜구와의 격전지라는 이야기도 있고, 개항기 의병들이 일본군과 싸우다가 마을로 피신한 길목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두 사건은 분명 큰 시간차를 두고 발생했으나,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 오랜 세월이 흘러 하나의 이야기처럼 시간성을 상실한 채 후세에 회자된다는 점이다.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난데없는 왜구의 침입이라니, 그 끔찍한 순간을 담담하게 이겨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고갯마루와 동구를 지키는 신령들, 그 가호(加護) 속에 자리한 마을]
1. 액을 막고 복을 불러[災厄招福] 마을을 평안하게 지켜 주는 수구막이 짐대
긴 나무 기둥 위에 오리를 앉힌 ‘솟대’를 공전리에서는 ‘짐대’라 부른다. 원공전과 장담 사이 너른 들판에 세워진 짐대 두 기는 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엄밀하게 이곳은 원공전 남쪽 장담과의 경계이자 동구(洞口)이다. 외부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액을 막는다는 뜻에서 ‘수구목’ 혹은 ‘수구지신(守口之神)’이라고도 한다. 내를 기준으로 서쪽 들 가운데 있는 것을 ‘남자 짐대’ 혹은 ‘큰서낭’이라고 하고, 내 건너의 짐대를 ‘여자 짐대’ 혹은 ‘작은 서낭’이라고 부른다. 두 짐대 모두에서 정성껏 고사를 지내지만 순서는 서편 남자 짐대가 우선이다.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짐대를 세우게 되었는지 그 유래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누대를 거쳐 정성껏 모셔 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 마을의 안과태평(安過太平)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 해마다 짐대에 고사를 지내는 날은 어떤 부정도 용납되지 않는다. 2011년에는 공교롭게도 구제역이라는 전무후무한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말았는데, 그로 인해 주민들의 마음속엔 올 한 해가 지날 때까지 ‘대고사’를 지내지 못한 섭섭함과 작은 죄책감이 남을 듯하다.
공전리 짐대는 4m 가량의 나무 기둥에 새 두 마리를 얹은 형태이다. 짐대를 구성하는 두 요소, 곧 장대와 새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장대 위에 얹은 것이 오리인지, 까치인지, 갈매기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그저 새 모양을 하고 있는 정도로만 인식할 뿐이다. 3년에 한 번 양질의 소나무를 구하여 4m 높이로 세우고, 바닥에는 잡석(雜石)을 쌓아 대를 고정시킨다.
고사 날짜는 좋은 날로 택일해 오다가 30년 전부터 음력 정월 초엿샛날로 고정되었다. 마을에서 책력을 잘 보기로 소문난 이동겸이 본인이 작고하기 전에 길일(吉日)로 제의 날짜를 고정시켰다고 한다. 제일이 유동적일 때는 마을에 초상이 나는 등 부정한 일이 생기면 날짜를 뒤로 미룰 수 있었다. 단, 2월은 ‘나무달[남의달]’이라고 하여 근신하고, 3월에 고사를 지냈다.
제관은 생기 복덕이 닿고 정결한 사람으로 셋을 뽑는다. 제물 마련은 ‘고양주’가 하고, 전체적으로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제관과 축관 몫이다. 이중 제일 먼저 신중하게 뽑아야 할 사람은 제물을 마련할 고양주이다. 일단 고양주가 정해지면, 고양주 집의 대문 앞에는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서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마을 사람들도 금줄이 쳐진 대문 안으로는 들어설 엄두조차 내지 않는다. 식구들도 초상집이나 산가(産家)와 같은 부정한 장소에 다녀오는 일을 삼간다. 그 외에 고사를 앞두고는 술과 담배를 삼가고, 누리고 비린 음식, 특히 개고기는 부정하다고 하여 잡지도 먹지도 않는다. 또한 일주일간 찬물로 목욕재계를 하고, 부부 합방도 금한다.
제비(祭費)는 ‘고사계’를 결성하여 충당해 왔다. 원공전 주민만 참여하는 고사였기 때문에 제비는 많지 않았다. 조금씩 걷은 원금으로 ‘고사답’ 5마지기[잼골에 3마지기, 우담에 2마지기]를 마련하여 여기서 난 소출로 제물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약 30년 전부터 논을 부칠 사람이 마땅치 않자 결국 고사답을 팔고, 주민들이 걷은 돈으로 제비를 충당하고 있다.
마을 대표는 하루 전에 장에 가서 제수를 구입한다. 가게 주인에게 고사에 쓸 제물이니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 돌아오는 길에 봉양 읍내의 술도가에 들르면, 도가 주인은 으레 막걸리 한 말씩을 덤으로 주며 올 한 해 고사도 잘 지내서 자신들도 덕을 보게 해 달라는 덕담을 한다.
고사 당일,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하면 고양주는 떡을 안치기 시작한다. 이때 떡은 하얀 백설기로 마을 사람이 많을 당시에는 고사 시루로 각기 한 말씩, 두 시루를 찌고, 덤으로 세 말 분량의 시루를 더 안쳤다. 가난한 시절에 주린 배를 채우기에는 다섯 말의 떡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 외에 밤·곶감·대추·포를 꼼꼼히 챙긴다.
저녁 9시경이 되면 제관 일행은 마련한 제물을 등에 지고 짐대 앞으로 향한다. 남자들은 부정한 곳에만 가지 않았다면 대고사에 참석해도 무방하다. 제관 일행은 ‘남자 짐대’ 아래에 백지를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모두들 한마음 한뜻으로 “올 한 해도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흡족하게 받으시고 농사도 잘되고, 주민 모두가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 주십사.” 하고 빈다. 제관이 술을 한 잔 따라 올리면 축관이 경건하게 축문을 읽기 시작한다. 이어서 고양주, 제관, 축관 이하 가가호호 소지를 한 장씩 올려 주며 농사도 잘되고, 집안이 평안하길 축원한다. 이 축원 내용이야말로 마을 주민들 개개인의 간절한 새해 소망이다.
고사가 끝난 짐대 아래에는 며칠 전에 쳐둔 금줄이 그대로 둘러져 있고, 산짐승과 들짐승까지도 배려한 제물이 고스란히 놓여 있다. 배고픈 시절 짐대 아래 남겨 둔 제물은 으레 ‘신령께 올린 길한 음식’이라 하여 아이들 차지였다.
2. 마을과 마을 사이, 높고 낮은 고갯마루마다 서낭이 자리한 마을
공전리의 자연 마을들은 과연 한 행정리에 속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넓은 지역에 드문드문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과 마을 사이, 고갯마루마다 서낭이 문지기처럼 지키고 있다. 약속이라도 한 것일까? 그 위치는 마을의 안과 밖, 경계 지점이다.
원공전과 싯개 사이 뱀고개 길의 벚나무 서낭, 원공전과 소시랑이 사이 합수머리 서낭당과 느티나무, 소시랑이 마을 입구의 서낭당, 장담 입구의 시무나무[가시나무] 서낭까지 자연 마을마다 서낭이 있는 셈이다. 이중 합수머리와 소시랑이 마을 입구에는 당집이 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당집 내부에는 해방을 전후하여 한문으로 묵서된 위패가 있었다고 하나 언제인가 모두 없어지고 느티나무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고 한다. 나이 든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정월이면 주민 모두가 이곳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낭제를 지냈다고 한다.
뱀고개 벚나무 서낭은 고갯길에 위치하여 지나가는 길손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돌이 수북이 쌓여 있다. 정월이면 아낙네들이 집안의 안과태평을 빌며 치성을 드리고 떼어 놓은 제물들이 벚나무 아래에 놓여 있었다. 정성껏 준비한 백설기 한 시루와 북어 한 마리가 제물의 전부였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기에는 충분했으리라.
[옛 이야기 들려주는 산 속, 여울 속 정겨운 이름들]
1. 산, 골짜기, 들 이름 속 무궁무진 이야기보따리
골골이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무궁무진한 마을이 공전리 말고 또 있을까? 산, 골짜기, 들, 심지어 나무와 바위 하나도 재미난 이름으로 불리고, 속이야기가 숨어 있다.
시랑산 어귀에는 하늘에서 표주박이 달린 실이 내려온다는 작은 샘이 있다. 표주박에는 늘 술이 고여 있었으나, 샘을 찾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졌다. 예컨대 양반이 가면 약주, 상민이 가면 막걸리가 담긴다는 것이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상민이 양반 행세를 하며 우물가를 찾았는데, 표주박에는 여전히 막걸리가 담겨 있었다. 술 한 바가지에도 신분의 귀천(貴賤)이 있다는 사실에 분개한 그가 가위로 실을 잘랐더니 그 자리에서 붉은 피가 샘솟았다고 한다.
공전천 건너의 깊은 골짜기는 ‘호랑이 웃방골[호랑이 안방골]’, 그 바로 아래는 ‘저고리골’이라 불린다. 골이 깊어 호랑이가 산다고 하며 호랑이 웃방골, 호환(虎患)을 당한 이의 저고리만 걸린 곳이라 하여 저고리골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호환에 갈 팔자는 따로 있다고 했던가? 세 명이 길을 가도 꼭 가운데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 간다는 것이다.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 가서 머리만 남겨 나뭇가지나 바위 위에 올려 두는 독특한 습성이 있다. 신기하게도 그 자리는 둘도 없는 명당으로, 이곳에 묘를 쓰면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속신이 있다.
소시랑이 북편 오솔길을 따라가면 과거에 절이 있었다는 ‘절터골’과 미륵 두 기가 세워져 있는 ‘미륵당’이 있다. 이 미륵이 어느 절에서 모셔졌던 것인지 그 내력은 알 수 없다. 다만 오래전 홍수에 떠밀려 온 것을 누군가 현재의 자리로 옮겨 놓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간이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언제부터인가 이곳은 부녀자들의 기도처가 되었다. 특히 아들을 바라는 부녀자들은 밤낮으로 무릎이 닳도록 찾아와서 치성을 드렸다.
2. 공전천 변 금빛 모래사장, 크고 작은 바위들이 들려주는 옛이야기
해마다 봄이 되면 공전천 변 모래사장은 마을 사람들로 시끌벅적하다. 합수머리에서 흘러 내려온 실개천이 공전천과 만나는 지점에는 넓고 큰 ‘막바위’가 있고, 그 위로 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다. 지금은 수심이 깊어져 막바위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봄꽃이 피기 시작할 3월이면 남자들은 삼삼오오 막걸리 한 말씩을 마련하여 이곳으로 천렵을 나온다. 피라미, 모래무지, 꺽지, 틈바구[퉁가리] 등 이름만큼이나 특이하게 생긴 작은 고기들을 잡는 재미가 쏠쏠하다. 물이 무척 깨끗해서 고기를 잡아 날로 먹기도 하고, 갖은 양념과 달걀을 풀어 국을 끓이기도 한다.
봄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여자들은 이곳으로 나와 특별한 방식으로 기우제를 지낸다. 여러 명이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서서 치[키]로 물을 뿌린다. 가운데 서는 사람은 반드시 첫 아들을 낳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녀는 머리에 소당[솥뚜껑]을 이고 있다. 솥뚜껑에 밥물이 맺히듯 하루 빨리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기우제 터로 유명한 ‘용바우’는 본래 ‘말바위’로 불렸다. 약 400년 전 선산 김씨 가문의 노파(老婆)가 이렇게 잘생긴 바위가 말바위라는 험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용바위로 부를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했다. 오명(汚名)을 씻어 준 고마움 때문이었을까? 며칠 후 노파의 꿈에 한 선사가 나타나 소원 하나를 들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노파는 그저 자손들이나 잘되게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꿈 때문이었는지 노파의 손자는 승지 벼슬까지 올라 가문을 빛냈다고 한다.
이외에 마두산 밑의 아들을 비는 ‘덤바우’, 1년 365일 오색천이 묶여 있는 ‘미기바우[매기바우]’, 냇가에 꼿꼿하게 서 있는 ‘독바우’, 조상의 신주를 모아서 모셔 두었다는 ‘신주바우’, 마당처럼 넓은 ‘마당바우’, 가마를 닮은 ‘가마바우’, 이따금 수달이 올라온다는 ‘수달피바우’ 등 재미난 이름으로 불리는 바위들이 도처에 즐비하다.
[철도 교통의 발달로 변화된 마을]
1. 제천장 서는 날 마을 회관 앞에는 장차가 서고
공전에서 제천장까지는 도보로 반나절 이상이 소요되는 무척 먼 거리이다. 새벽녘에 잰걸음으로 출발해도 점심때가 되어서야 도착할 수 있다. 해방 직후 마을에는 군용차[쓰리코다·다찌차]를 개조한 일명 ‘장차’가 있었다. 이 차는 이인구 형제가 개인 소유로 운영하던 것이다. 대중교통이 생기기 직전 개인이 운영했던 마을버스인 셈이었다. 정원은 15명이었지만 두 배 이상 사람을 태워야 했기 때문에 애초에 짐칸이란 개념은 없었다. 운전석을 제외하고는 좌석이라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 사람과 짐이 뒤엉켜 있었다.
장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마을 회관 앞은 장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북적댔다. 연장자부터 차례로 편한 자리에 모시고, 젊은이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눈치를 봤다. 차비가 비싼 편이어서 아이들은 장에 데려갈 수 없었다.
장차는 버스와 철도 교통이 발달하기 직전까지 마을 주민들의 외부와의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다. 운전 미숙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도 발생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반나절 걸리는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시킨 편리함이었다.
2. 철로가 마을을 가로지르고 싯개에 공전역이 생길 무렵
공전리가 번화한 시기는 공전역이 생기고 한창 이용객이 늘어날 무렵이었다. 통학 시간이면 이웃 마을에서 찾아오는 학생들, 제천으로 물건을 팔러 나가는 장사치들로 인해 공전역 곳곳이 시끌벅적했다.
오늘날 마을의 남동과 남서 방향으로 난 충북선 선로는 새로 생긴 것으로, 구철길은 원공전 마을 안까지 깊숙이 들어서 있었다. 1955년도부터 철길을 닦기 시작해서 1959년도에 기차가 다닐 때까지 마을 주민들이 철로 공사에 동원되었다. 당시 품값으로 어른은 600원, 아이들은 500원을 받았다. 농사일 품값이 3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보수는 좋은 편이었다. 아마도 일이 고되고 위험해서 보수가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1958년 싯개에 역사가 생기고 이듬해 1월부터 열차가 운행되기 시작했다. 공전역은 삼탄역과 봉양역 사이의 보통역으로, 하루 5차례 기차가 정차했다. 통학 시간인 아침 7시에 이어서 9시·12시·4시·9시 모두 왕복으로 운행했기 때문에, 공전역사는 온종일 활기가 넘쳤다.
마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라지면서부터였을까?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공전역을 찾는 승객 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루에 5~6차례 마을까지 버스가 들어온 뒤로는 더 기차를 타지 않게 되었다. 결국 6년 전에 공전역도 문을 닫고, 지금은 마을 사람들의 옛 추억을 더듬는 주요 소재로 회자되고 있을 뿐이다.
- 『한국지명총람』3-충북편(한글학회, 1970)
- 이필영, 『솟대』(대원사, 1990)
- 이필영, 『마을신앙의 사회사』(웅진출판사, 1994)
- 구완회, 『한말의 제천의병』(집문당, 1997)
- 『문화유적분포지도』-제천시(충북대학교 박물관, 2003)
- 『제천시지』(제천시지편찬위원회, 2004)
- 박병철, 「제천 지역 고유 지명어에 대응하는 한자 지명어 연구」(『어문연구』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 인터뷰(공전 1리 최민영, 남, 68세, 2011.)
- 인터뷰(공전 1리 조정희, 남, 83세, 2011.)
- 인터뷰(공전 1리 김석돌, 남, 60세, 2011.)
- 인터뷰(공전 1리 이인화, 여, 67세, 2011.)
- 인터뷰(공전 1리 정영순, 여, 74세, 2011.)
- 인터뷰(싯개 마을 한진우, 남, 77세, 2011.)
- 인터뷰(싯개 마을 김영복, 남, 78세, 2011.)
- 인터뷰(싯개 마을 한선우, 남, 78세, 2011.)
- 인터뷰(싯개 마을 김종기, 남, 2011.)
- 인터뷰(소시랑이 마을 최동환, 여, 80세, 2011.)
- 인터뷰(소시랑이 마을 우상두, 남, 71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