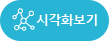| 항목 ID | GC09000687 |
|---|---|
| 한자 | 扶餘 皐蘭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 菩薩坐像 |
| 영어공식명칭 |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and Seated Bodhisattva of Goransa Temple, Buyeo |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 유형 | 유물/불상 |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689 |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 집필자 | 소현숙 |
| 제작 시기/일시 | 조선 시대 - 부여 고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보살좌상 제작 |
|---|---|
| 문화재 지정 일시 | 2011년 7월 20일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21년 11월 19일 - 부여 고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보살좌상 충청남도 문화재자료로 변경 지정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24년 5월 17일 - 부여 고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보살좌상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로 변경 지정 |
| 현 소장처 | 고란사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689
|
| 성격 | 불상 |
| 재질 | 나무 |
| 크기(높이) | 높이 94㎝, 무릎 너비 60.5㎝[아미타여래상]|높이 82㎝, 무릎 너비 49㎝[보살좌상] |
| 소유자 | 고란사 |
| 관리자 | 고란사 |
| 문화재 지정 번호 |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 |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고란사에 있는 조선 후기 불상.
[개설]
부여 고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보살좌상(扶餘 皐蘭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菩薩坐像)은 아미타여래 좌상을 중심으로 양쪽에 두 보살이 안치되어 있다. 삼존상 가운데 아미타여래좌상과 오른쪽의 보살좌상은 얼굴, 신체 비례, 조각 기법 등이 유사하여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오른쪽 보살상은 대세지보살로 추정되나, 손의 위치 등으로 미루어 현재 봉안 위치가 원래의 자리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왼쪽의 보살상은 백의관음(白衣觀音)으로 다른 두 상과 크기와 형식 등이 판연하게 다른데, 근래에 다시 만들어 봉안한 것이다. 2011년 7월 20일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418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어 충청남도 문화재자료로 변경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로 바뀌었다.
[형태]
아미타여래상과 오른쪽 보살상은 모두 둥글넓적한 얼굴과 어깨, 그리고 짧은 목을 갖고 있다. 둥글게 표현된 무릎 역시 동일하다. 아미타여래상은 머리와 살상투[육계(肉髻)]의 구분이 없으며, 중간과 정상에 구슬[계주(髻珠)]을 표현하였다. 두 어깨를 감싼 대의를 입고 있다. 오른손은 들어 올리고 왼손은 발 위로 내렸는데,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다. 오른쪽 보살상은 아미타여래상과 마찬가지로 대의로 두 어깨를 감싸고, 가슴에는 세 개의 줄이 늘어지는 목걸이를 착용하였다. 두 손의 모양도 위치만 다를 뿐, 아미타여래상과 유사하다. 아미타여래상과 오른쪽 보살상은 어깨를 가리는 대의 형식 뿐 아니라, 배와 무릎의 옷 주름 표현도 동일하며, 대의 자락 끝이 왼쪽 무릎 쪽으로 내려오는 형식도 같다. 옷 주름과 보살상의 목걸이 등에서 보듯 전체적으로 표현이 간략해졌다. 아미타여래상은 높이 94㎝, 무릎 너비 60.5㎝이고 보살좌상은 높이 82㎝, 무릎 너비49㎝이다.
[특징]
아미타여래상과 오른쪽 보살상에 공통으로 보이는 어깨를 움츠리고 목을 앞으로 내민 자세, 머리가 비교적 큰 신체 비례 등은 조선 시대 후기 불상의 특징이다. 보살상의 귀를 감싸고 어깨로 내려오는 머리카락의 표현도 조선 후기 보살상에서 일반적으로 출현한다.
[의의와 평가]
부여 고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보살좌상은 비록 옷 주름이 간략해졌지만 조선 후기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彫刻僧) 유파인 수연파(守衍派)의 영향이 보인다. 조선 후기 지방 불교 조각의 한 흐름을 알려주는 작품으로 미술사적 가치가 있다.
- 최선일, 「17세기 전반 조각승 수연의 활동과 불상 연구」(『동악미술사학』8, 동악미술사학회, 2007)
-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 조각의 독창성」(『미술사학』28,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4)
- 문화재청: 부여 고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보살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