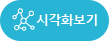| 항목 ID | GC03201691 |
|---|---|
| 한자 | 情謠 |
| 영어음역 | Jeongyo |
| 영어의미역 | Song of love |
| 이칭/별칭 | 「상사 노래」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문화유산/무형 유산 |
| 유형 | 작품/민요와 무가 |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 집필자 | 김기현 |
[정의]
경상북도 김천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임을 그리워하는 노래.
[개설]
「정요」는 남녀의 사랑을 짧은 사설로 드러내는 유희요이다. 이를 「상사 노래」라고도 한다. 이러한 「정요」는 김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불렸음을 여러 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록/수집 상황]
1961년 임동권이 집필하고 집문당에서 발행한 『한국민요집』 1권과 4권에 김천 지역 민요로 4편이 수록되어 있으나 그 외의 상황은 알 수가 없다.
[구성 및 형식]
다른 지역에 비해 김천 지역의 「정요」는 매우 짧은 두 줄 형식의 노래이며, 이러한 짧은 사설 속에 임에 대한 애정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자료의 노래는 「꽃노래」, 「아리랑」, 「그내 노래」 등의 사설이 혼재해 있다.
[내용]
「정요」1
성노꽃은 상객가고/ 지정꽃은 장개간다/ 만인간아 웃지마라/ 귀동자를 바래간다.
「정요」2
우수경칩에 대동강풀리고/ 정든임말씀에 요내가슴풀리네.
「정요」3
아주까리 동백아 열지마라/ 재년의 기름머리 눈꼴난다.
「정요」4
주천동 내모진남개/ 단사실로 그네를 매고/ 님이띠면 내가밀고/ 내가띠면 님이민다/ 님이야 줄이지마라/ 줄끄너지면 정떨어진다.
[현황]
「정요」는 흔히 유희요로서 많이 불렸지만 우리 사회가 근대화를 이루면서 유희요를 대체하는 대중가요들이 많이 나타남으로써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의와 평가]
우리 민요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나 애정을 주제로 하는 노래는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정요」를 통해 인간의 본질적 감성인 애정에 대한 옛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기에 이 민요가 가진 의의는 매우 크다.
- 임동권, 『한국민요집』1·4(집문당, 1961)